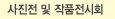면옥치리에서 21명이 동사(凍死)한 내막
페이지 정보
본문
면옥치리는 38선 접경인데 공비가 자주 출몰하였다. 도채바우(주89) 등을 타고 가면 매봉령으로 곧장 나가고, 또 양양 정족산을 타고 벽실령 줄기가 매봉령으로 나가니 공비의 루트(길)가 되었다. 또 벽실령에서 면옥치를 내려다보면 바로 그 아래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 양식 등을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다.
1952년경이었다. 당시 양양군이 수복이 되어도 아직 제대로 치안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당시 면옥치리는 강릉군에 속하였고 어성전을 필두로 하여 면옥치리는 강릉군 현북면이 되었고 주문진경찰서(주90)에서 경찰 7명~8명이 현북면에 파견을 나와 치안을 유지하고있었다. 공비들이 자꾸 출몰을 하니 경찰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어성전1리-2리, 장리, 원일전, 법수치, 면옥치리 등 인근마을의 젊은 청년들을 차출하여 임시로 의용경찰을 조직하였다. 이들이 요소마다 다니면서 경계를 섰는데, 보통 한 번 경계를 서면 3일을 기본으로 하여 섰다. 그러니 3일 되어야 교대를 하는 것이었다. 경찰 역시 동일하였는데 당시 면옥치리에는 경찰 두 명이 파견을 나와 있었다.
도체바우 밑에 외딴 집이 한 집 있었다. 이 집에 공비들이 자주 출몰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벌써 공비는 멀리 사라지고 없곤 하였다. 잠복을 하면 어떻게 용케 알았는지 나타나지 않고 하여튼 공비 때문에 골머리를 싸안고 있을 무렵이었다.
음력 2월 21일경(양력 3월 16일)이었다.(주91) 그 날도 공비가 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 날 어성전리, 원일전리, 장리, 법수치 사람들이와 지키는 날이었는데, 신고가 들어오니 경찰 두 명이 공비를 잡으러 가자고 하여 총 22명이 출동을 하였다(주.92) 그때 눈이 많이 왔기 때문 에 발자국을 따라 쫓기가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얼마쯤 가니 등 너머로 가는 공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뭐라 잘 들리지는 않지만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하면서 약을 올리는 것처럼 들렸다. 그렇거나 말거나 주민들은 돌아가자고 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음식도 동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들이 계속 쫓아가자고 주장을 하니 주민들은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면옥치리의 서경석은 일제강점기 때 징용을 갔다온 경험 많은 노련한 사람이었다.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경찰에게 돌아가자고 간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게 대놓고 “몸이정말 아프다. 더 쫓아갔다가는 내가 죽겠다. 나는 더 못 가겠다”고 하였다. 경찰들은 그러면 당신은 가라고 허락을 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 서경석은 무사히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공비를 잡으러 간 사람들과 약속한 신호를 보냈다. 신호는 다름 아닌 총소리였다. 하늘로 쏘아보낸 공포를 듣고 공포가 같이 올라오면 안전한 것이었는데, 아무리 하늘로 공포를 쏘아도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당시 마을마다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쓰던 것으로 손잡이를 돌려서 신호를 보내던 전화기였다. 이웃마을에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더니 곧이어 의용경찰과 마을젊은이들 100여 명이 지원을 나왔다. 이들의 지원을 받아 수색대를 조직하여 공비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왔음직한 곳으로 수색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발자국은 벌막골로 이어졌다.벌막골은 험하기 그지없는 골짜기였다. 곳곳마다 물웅덩이고 돌들도 뾰족하여 다치기 십상인 곳인데 눈마저 쌓여 있으니 이 곳으로 내려갔다면 필경은 야단이 났을 것이라 짐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벌막골로 내려가면서 수색을 하니 하나둘 사람들의 시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물웅덩이에 빠졌다가 죽은 사람, 내려오다 미끄러져 죽은 사람 등등 대부분이 죽어 있는 듯했다. 그런데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한 사람이 살아있었다. 두 사람이 몸을 꼭 껴안고 죽어있는 와중에 한 사람이그 속에 들어가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일행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는데 조준기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여 공비를 잡으러 갔던 이들은 조준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21명 모두가 사망하고 말았다.
후에 조준기로부터 전해들은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다. 공비를 뒤쫓아가는데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공비 때문에 일행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다. 출발할 때 음식은 점심만 준비해 갖고 쫓았었다. 더구나 밤이 되자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앞은 시계 제로인상황이었다. 경찰은 그때가 되어서야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왔던 길로 돌아간다면 앞일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마을로 가는 지름길인 벌막골을 통하여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비록 벌막골이 험하다고 소문은 났지만, 조심해서 내려가면 20리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상당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상면옥치 서낭목
그러나 계곡은 만만하지 않았다. 물웅덩이가 곳곳에 있어서 한 번 빠졌다가 나오면 금새 물기가 고드름이 되어 온몸을 조여왔다. 조준기는 나이가 가장 어렸기 때문에 맨 뒤에서 쫓아왔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더 이상 내려오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껴안고 죽어있는 두 사람 틈바구니로 끼어 들어갔고,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악전고투를 하다가 결국은 한 명만 남긴 채 모두 죽게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조준기를 일러 천명이라 하였다. 그러나 천명, 즉 하늘의 명을 받았다던 그도 이내 10년이 채 되지 못해 자살하고 말았다.
이웃마을의 사람들은 서낭이 노했다고 수군거렸다. 면옥치리 본말은 3월에 마을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이들이 출발하기에 앞서 서낭에 들러 마을제사에 쓰려고 준비해놓은 술을 꺼내먹고 출발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런 루머도 있기에 아울러 기록한다.
----------------------------------------------------------------------------------------------------------------------------------------------
(주89) 화채와 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 화채바위라 불렀는데, 후에 와전되면서 도채바우가 되었다. 고경재 편,『양양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1995, 261쪽 참조.
(주90)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주문진에 경찰서가 있었다.
(주91)『양주지』에는 3월19일로 나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유족들의 제삿날은 음력 2월21일이었다.
(주92) 당시에 출동한 순경2명은 김정운, 전호길이었고, 마을주민들은 상면옥치 주민 7인, 면옥치리 1반(월아치) 주민 3인, 법수치리7인-8인, 기타 등이었다.
-
- 이전글
- 농촌과 어촌은 1촌
- 10.04.06
-
- 다음글
- 뱀에 물리면
- 10.04.06